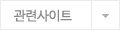시선의 중심을 자녀에게

지난주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세 번째 세대통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휴스톤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의 칼럼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6월초 영어부와의 강단교류 때, 영어부 설교를 마쳤는데 헌신 시간에 한 부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기도 받으러 나왔습니다.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얼핏 보기에 2살, 4살 정도였는데, 아이들과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사연을 들어보니 아이들은 모두 뇌가 자라지 않는 특이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뇌가 자라고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기만 할 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고, 둘째도 똑같은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싶었는데,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두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사랑스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런 상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분노나 원망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조용한 목소리로 사연을 얘기하며 본인들은 한국말을 알아들으니 한국말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엄마들은 모성애가 강하게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아빠는 그 상황을 짜증스러워 하거나 피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내와 아이들을 온유하게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부부와 직접 얘기를 나누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은 자녀가 나의 행복의 수단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시선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런 분들은 보통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선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고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때도 보통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출신의 아이를 찾지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장애가 있거나 상황이 어려운 아이를 마다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이런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 역시 부르심의 일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실 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며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맡길 사람도 부탁할 사람도 없었기 자신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다는 생각에 오히려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의 차이가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일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놀랍고 경이로웠으며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 당부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 주최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