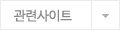이별 말고 작별

어느 목사님이 오랜 시간 목회를 해도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하고 떠나든, 문자 하나 툭 남기고 떠나든 여전히 적응이 안 되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교회를 방문한 목사님과 떠나간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간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전도해서 섬겼던 가정을 떠나보내고 서운했지만 잊으려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계속 눈물이 났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너무 보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목회하다 보니 다양한 이별을 경험합니다. 이민교회도 비자의 문제로 떠나고, 갈등으로 떠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교회로 이동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했던 교인이 떠나가는 일들이 반복되면 목회자도 남은 성도들도 마음의 상처들이 쌓여만 갑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떠나보내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성도들을 떠나보낼 때는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 하는 자책이 밀려와 애써 잊으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목자, 목녀들에게도 가장 힘든 순간은 열심히 섬겼던 목장 식구가 떠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와 목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떠날 때 목자, 목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혹시 또 떠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영혼 구원을 향한 용기와 에너지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나가는 것이 목회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헤어짐을 ‘이별이 아니고 작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별과 작별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이별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단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공동체에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반면에 작별은 다시 만남을 약속하는 헤어짐입니다. 떠나지만 관계는 이어지는 떠남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떠나는 것이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헤어짐입니다. 작(作)’은 ‘하다.’‘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별은 헤어짐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떠남은 이별의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떠나고, 섭섭함을 품고 떠나고, 오해를 풀지 않은 채 떠나고, 준비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기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손절하고, 상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이별은 교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별이 아니고 작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반드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떠나는 자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보낼 때 마지막까지 축복하며 보낼 수 있다면 이별은 작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 대양주 가사원장 송영민 목사





 vip중심의 신앙(목장)이란?
vip중심의 신앙(목장)이란?